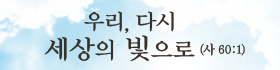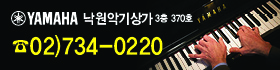테살리아 지방의 왕 또는 지주로 알려진 에리식톤(Erysichthon)은 큰 부자였고 매우 거만했다. 그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이 가장 멀리 해야 하는 신에 대한 독신죄(瀆神罪)를 범한 사람이었다. 에리식톤은 자신의 농경지를 더 넓히기 위해, 농경의 여신 데메테르(Demeter)에게 바쳐진 거대한 숲을 없애 버리는 과정에서 여신의 신목(神木)으로 숭배되며 화관으로 장식되어 있는, 숲 속 한가운데 서있는 거대한 참나무를 베어버렸다. 이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님프 하마드라이어드(Hamadryade)가 변신한, 매우 신성한 나무였다. 이 나무를 지키던 늙은 하인 한 명은 나무 앞을 막아서다가 도끼에 맞아 죽었다. 첫 도끼질에 참나무가 피 흘리며 신음 소리를 냈으나 에리식톤은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다. 참나무 속에 깃든 님프의 영혼이 ‘이 원한은 데메테르 여신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라고 저주하였다. 숲 속의 다른 정령과 짐승들도 나무요정의 죽음을 목 놓아 통곡하였다. 데메테르는 크게 분노하여 기아(飢餓, 배고픔)의 여신인 리모스(Limos)를 찾아갔다. 리모스는 불경한 에리식톤을 벌하기 위해 자신이 머무르던 땅을 떠나 테살리아로 갔다. 한밤중 몰래 에리식톤의 침실로 숨어들어 잠자고 있는 에리식톤의 피에 자신의 피를 섞어 놓고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에리식톤은 이제껏 단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끔찍한 배고픔에 시달리게 됐었다. 그는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먹었으나 배고픔은 그칠 줄 몰랐고, 결국 먹는 것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도 배고픔은 끝나지 않았다. 모든 재산을 처분해버린 에리식톤은 그의 딸인 메스트라(Mestra)까지 팔아서 식량을 샀다. 그의 딸은 아버지와 달리 매우 신실하고 착한 소녀였다. 포세이돈의 사랑을 받아 변신 능력이 있는 딸은 팔려갈 때마다 암말, 새, 사슴, 염소 따위로 변신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다른 동물로 변신하여 탈출 후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지만, 에리식톤은 계속 돌아오는 딸을 신기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그저 딸을 다시 팔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딸 메스트라를 계속 팔아 식량을 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량 대신 팔려갔던 메스트라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오게 되었다. 딸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식량을 다 먹고도 배고픔을 이길 수 없던 에리식톤은 자기 몸을 먹기 시작해 발과 손부터 시작하여 전신을 뜯어먹던 그는 결국 치아만 남아서도 계속 굶주리고 있다 전해진다.
요즘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개인과 기업, 국가의 끝없는 욕망을 일컬어 에리식톤 콤플렉스란 용어를 빗대어 표현한다. 자본주의란 자본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다. 자본이란 곧 돈이다. 돈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 자본주의를 존재하게 한다. 하지만 그런 탐욕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낙오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고 있다. 자본은 자본이 많은 사람에게 흘러들게 되어 있다. 자본가는 더욱 많은 자본을 갖게 되고,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낙오할 수밖에 없다. 독신죄를 범한 에리식톤은 신들로부터 먹어도, 먹어도 배고픔이 꺼지지 않는 걸신병을 앓게 된다. 에리식톤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먹을 것을 구입했다.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더 이상 팔 것이 남아있지 않자 자신의 딸까지도 팔았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난 뒤에도 만족할 수 없었다. 에리식톤은 결국 자신의 몸까지 다 뜯어 먹어 죽음에 이르면서까지 허기를 채우려는 욕망에 사로잡힌다. 독일 카셀대학의 김덕용 교수는 한국의 자본주의 정신을 일컬어 에리식톤 콤플렉스라고 명명하였다. 그리스 로마신화에 에리식톤이 있듯이 우리 자본주의에 이러한 에리식톤의 저주 받은 태도가 묻어나는 걸 비유한 것이다.
고영표 장로 (의정부영락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