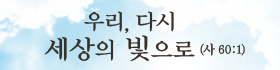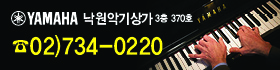– 나라는 깨어졌으나 산과 강은 그대로 있구나 –
1970년대 중반, 신일고등학교에서 담임했던 한 학생의 어머니가 일본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하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번 일본여행은 일본의 농촌 지역을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여러 곳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아주 속이 상하고 약이 올랐습니다. 시골 마을의 도로와 골목이 모두 깨끗이 포장이 되어 있었고 모든 산은 녹음으로 우거졌으며 농촌의 가정 가정마다 TV,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 기기가 모두 갖춰져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년 과정을 왜정(倭政) 때 공부했는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일본으로 쫓겨 간 그들이 너무도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몹시도 속이 상했습니다. 그들이 잘 사는 것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너무도 못사는 것이 아주 속상했어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여름, 우리 가족은 반려견(伴侶犬)을 데리고 대전 근교의 한 야영장을 찾아 며칠 간 더위를 식힌 일이 있었지요. 대전 근교의 시골길을 오가면서 바라보는 산하(山河)는 어디 한 곳 손댈 곳이 없을 만큼 아름다웠고 농촌의 가정들도 다양한 전자 가전품(家電品)을 갖추고 사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1970년대 일본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속상한 마음으로 ‘귀국보고(?)’를 하던 그 학부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당시 일본 농촌의 문화의 수준이 오늘의 우리 농촌의 상황과 비슷했었겠구나’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글의 제목으로 돌아가서 “국파산하재(國破山河在)”의 뜻을 살펴봅니다. “國(나라 국)/ 破(깨뜨릴 파)/ 山(메 산)/ 河(물 하)/ 在(있을 재)”이니 풀이해보면 “나라는 깨어졌으나 산과 강은 그대로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구절은 중국 당나라의 시성(詩聖)으로 불리는 두보(杜甫, 712~770)가 지은 유명한 시 『춘망(春望: 봄을 기다리며)』의 첫 구절에 나오는 글귀인데, 당시 당(唐)나라 전체가 실정(失政)과 내란으로 어지러웠던 세태를 대비(對比)해 묘사한 말입니다. “나라는 쪼개지고 백성은 흩어졌으나 오직 산과 강만은 그대로 남아 있구나!”하는 탄식이지요.
당시 당나라의 황제 현종(玄宗, 재위 712~756)은 초기에 명신(名臣)들의 보좌로 태평천하를 이루었으나 황제가 절세(絶世) 미인 기생 양귀비(楊貴妃)에 빠지고 신하로서 권력을 휘두르던 권신(權臣)과 이임보(李林甫) 등에게 정사(政事)를 맡기고부터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니 급기야 755년 황제 주변의 간신배들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안록산(安祿山)의 난(亂)』이 일어나 수도 장안(長安)이 점령되는 등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40세까지 별다른 벼슬 없이 떠돌던 두보는 43세가 되어서야 겨우 미관말직(微官末職=지위가 아주 낮은 벼슬)을 얻어 가족과 함께 그럭저럭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다음 해 전란(戰亂)으로 가족을 피신시키고 자신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겨우 풀려난 두보는 장안에 머물면서 황량(荒凉)한 거리를 보고 옛 영화를 생각하며 나라와 처자식이 걱정이 되어 이 시 『춘망(春望)』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쓴 명시(名詩)의 전문(全文)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나라는 깨어졌어도 산하는 그대로 있구나(國破山河在)/ 성안에 봄이 오니 초목이 무성하다(城春草木深)/ 때를 느꼈는지 꽃도 눈물 뿌리고(感時花濺淚)/ 이별이 서러운지 새도 놀란 듯 우네(恨別鳥驚心)/ 봉화가 석 달이나 이어지니(烽火連三月)/ 집안의 편지는 ‘만금의 값어치’라(家書抵萬金)/ 흰 머리는 긁을수록 더욱 짧아져(白頭搔更短)/ 쓸어 묶으려 해도 비녀도 이기지 못하네(渾欲不勝簪).”
최근 우리의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시성(詩聖) 두보(杜甫)의 심정을 방불(彷彿)케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이 글을 끝맺고자 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누란(累卵)의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은 소망 있는 민족이요,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예비한 구원의 방주(方舟)입니다. 지난 7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과 발전된 시민의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야(與野)의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정일 장로
<대전성지교회•목원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