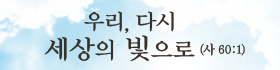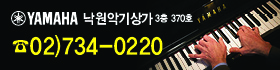“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니체’는 말했고, “인간은 망각 없이 이루어진 행복은 있을 수 없다”고 ‘모루아’는 말했다. 나는 요즘 이 말들을 입버릇처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말들이 기억력이 쇠퇴한 나의 처지를 방어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모른다. 아니 모르겠다는 말보다는 나 자신의 변명이라 함이 솔직한 표현이 아닐까.
요즘 나는 당혹스러울 때가 참 많다. 길거리에서 다정한 사람을 만날 때나 혹은 어느 모임 혹은 손님이 내 집에 찾아왔을 때에 주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상대방은 나를 잘 알고 있어 다정하게 인사하고 반가워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어디서 보았는지, 혹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아 어찌할 줄 모른 채 쩔쩔맬 때가 있다. 어찌된 일인가. 나이 탓으로 돌리기엔 너무 빠르지 않는가.
어느 날은 문학모임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갓 40대로 보이는 중년 여인이 반갑게 얼굴에 꽃물을 들이며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인사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도대체 누굴까. 제자일까. 교인일까. 문인일까. 아니면 사회에서 만난 사람일까. 도무지 알 길이 없다. 누구란 말인가. 이것을 분별해야 무어라고 대답할 터인데 어떻게 대답해야지. 학교에서 가르친 제자라면 반갑게 반말해도 되겠고, 교인이라면 직분을 말해야 정감이 피어오를 것이며, 문인이라면 요즘 좋은 글을 많이 쓰십니까? 해야 격이 맞는 말이 아닌가.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분이라면 존칭어를 써야 하는데 무어라 답변해야 옳을지. 어안이 벙벙하다. 그렇다고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미안합니다. 누구시지요?”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실례가 될까. 내심으로 퍽 당황스러운 때였다.
내 눈치를 알아차렸는지 “선생님, 저 누구예요. 어디에서 수필을 선생님께 배웠어요.” 하지 않는가. 그제야 “아, 그렇지. 내 정신 좀 봐”라고 했더니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선생님을 무척 따랐는데요” 하지 않는가. 어딘지 모르게 서운한 눈치였다. 정규학교인 고등학교 혹은 대학에서 가르친 제자는 분명히 아니었다. 두 해 전, 모 문학회에 출강해 수필을 강의할 때 가르친 제자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늘 즐겨 사용했던 단어들도 대화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 뒷말을 잇지 못해 다른 말로 얼버무려야 하는 아쉬움을 느낄 때도 있고, 평상시에 자주 만나 수시로 친분을 나누었던 분의 이름 역시 깜박 잊어버려 고역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건망증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잦아지기에 병원을 찾기도 했다. 의사는 별 이상이 없으니 너무 신경을 쓰지 말아 달라고 한다. 만일 이것이 스트레스로 변해 쌓이면 정말 병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라는 당부였다.
내 주위에는 기억력이 뛰어난 분이 계셨다. 그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생전의 일이다. 당시 85세의 고령인데도 한번 만난 분의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 날 대화 내용까지도 기억해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한다. 더구나 화술마저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어느 모임이든 그분은 인기가 높아 오늘은 제가 점심을 꼭 대접하고 싶다는 분들이 줄을 잇는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며 따른다. 국제 세미나에서 만난 외국 사람들까지도 그렇다. 이분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가 없다.
하재준 장로
중동교회 은퇴
수필가·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