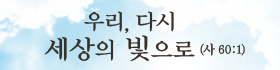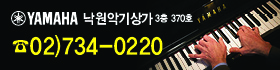맏이 도제 시인의 ‘고별’은?

아들 황도제시인과 함께
고별
당신의 자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 가만히 손도 잡아 봅니다 사랑이 따스하군요 / 당신도 내 손을 잡는군요 / 처음 만나던 날의 떨림이군요 / 어떻게 알았을까요 떠나는 인사임을 / 어깨에서 앞가슴으로 흐르는 흐느낌 / 자신의 탓이라고 혼절하는 장면 눈에 보이는군요 / 어린놈도 함께 우는군요. 용서해 주세요 / 변명과 이유는 구차스러워 접습니다 / 이제 고별입니다. / 그동안 함께 살아온 인사치레로 조금만 우세요 / 아직도 사랑이 남아 있는 세상 떠나갑니다.
2007. 11. 17.
이 시는 맏이 도제 시인이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인 2017년 11월 17일에 쓴 시이다. 스스로 아버지 황금찬 시인보다 먼저 갈 것을 예감하고 쓴 시가 아닌가. ‘고별’은 죽기 전에 아버지를 향해 쓴 고별사(告別詞)이다.
<2009년 장남인 황도제 시인은 먼저 떠났다. 황도제 시인과 나는 같은 “응시(凝視)” 동인으로 가깝게 지냈다. 그는 문학행사장에서 사회를 맡아 행사 진행을 조리 있게 진행해 문단에 알려졌었다. 황도제는 아버지와 함께 펴낸 사화집 <구름호수 소녀>(1994년)에서 아버지의 시 세계를 다룬 바 있다.> (장일남 시인의 회록에서)
황금찬 시인이 동경 유학시절, 그가 다니던 교회는 조선 유학생 중심으로 모이던 ‘한국학생교회’였다. ‘간다’에 있던 이 교회에는 약 300여 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했다. 언젠가 조ㅇㅇ 담임 목사가 주보에 시 한 편씩 싣자는 제의를 받고 1년 반여 동안 시를 주보에 게재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조 목사께서 일본 경찰서에서 더 이상 황금찬의 시를 싣지 말 것을 강요해 싣지 못했다. 다음 시는 주보에 실으려다 중단되어 싣지 못하게 되자 마지막으로 써 두었던 시의 전문이다.
<이것이 마지막/기도입니다./이제 또 언제 시 기도를/드릴지 알수 없습니다//당신의 성전이 높이 솟은/어느 도시나/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숲을 이룬 산이나 언덕/그런 곳에서 다시 당신에게/기도드리게 하여 주십시오//삶의 풍속이 같고/의사 표시의 방법이 같은/말로써 주님/마음에 가득한 정성을/고하게 하여 주십시오//주님/언제 우리의 주님을/마음 놓고 주님이라고/부를 수 있게 되겠습니까/그날을 우리들에게/가르쳐 주십시오/그날을 알게 되면/그날이/우리에겐 다시 사는 날이 되겠습니다/그날을 주십시오/그날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그날 당신에게/기도드리는 사람은/비로소 당신을/하늘에 계시는/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요/주님을/구원의 주님이라고/부를 것입니다//주님/당신을 다시 만날/기약이 없습니다/그러나 우리는 기다리렵니다/방해의 숲이 아닌/자유의 바다 위에서/깃발처럼 휘날리며/당신을 부르겠습니다//그 날을 주십시오/그 날을 주십시오/주님> (‘마지막 시’의 전문)
박이도 장로
<현대교회•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