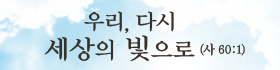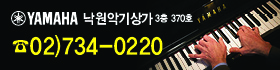2014년 총회에서는 영아부가 없는 주일학교가 전국 79%라고 발표한 바 있다. 10년이 지난 2024년 통합측 총회 전체 교인수와 세대별 교인수를 발표했다. 23년 109회 기준 220만 7천982명 중 영유아유치부 3%, 중등부 3%라고 발표했다. 이 숫자는 재적이 기준이기에 출석을 기준으로 한다면 2%∼1.5% 사이일 것으로 예상되는 충격적인 통계이다. 이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국가를 뜻하는 미전도 종족 수준인 것이다.
그러나 교단 및 신학교 리더십에서 바라보는 시각에는 온도 차이가 있다.
“우리 교단과 교회들은 건강하고 큰 교회가 많아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음세대 현장은 미전도 종족이 되었고 교회학교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교회학교 생태계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민족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시며 사마리아인처럼 살라고 말씀하신다. 당시 주류였던 제사장, 레위들이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말씀을 던지신 것이다. 인식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바꾸라는 것이다.
첫째, 먼저 장년과 교회학교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장년 성도들은 20세부터 100세까지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때문에 감소폭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교회학교는 1년 단위로 입학과 졸업을 반복하며 오래 머무는 사역이 아닌 올려보내는 사역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교회학교 전문 사역자를 발굴하고 양성해야 한다.
교회학교는 전임이 되기 위한 첫 과정이며, 2∼3년 사역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교단와 신학교에서 인식시켜야 하며, 교구와 교육부의 사례를 동일하게 책정해야 한다. 교회학교에 전문사역자가 없는 이유는 심플하다. 교구와 교육부 사례가 거의 1.5∼2배 차이가 난다. 또한 교구를 거치지 않으면 담임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생태계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교회학교 전문 사역자는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이론이 아닌 실천적인 교육이 많이 발굴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학부, 신대원 6년이라는 과정 가운데 실제 교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과목은 정말 극소수이다. 점점더 교회현장 전문가가 신학교에서 나올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LG전자는 회사 안에 대학원이 있다. 왜냐하면 기업 현장 전문가를 기존 대학의 커리큘럼 안에서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자체 대학원을 개설하고 있다.
넷째, 영적 국수주의를 탈피해야 한다.
국수주의란 자신의 민족이나 국가의 전통·문화·정치·역사만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믿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 문물들을 배척하는 극단적인 태도나 경향, 또는 내셔널리즘을 뜻한다.
교단의 신학을 양보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단이 아니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역이라면, 다음세대를 살릴 수 있는 사역이라면 과감하게 배우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 협업이라는 것을 한다. 한국교회에 거룩한 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할 것이다. 과거 부흥을 경험한 한국교회, 그 영광에 취해 계속 머물러 있다면 교회학교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다섯째, ‘교회 ↔ 학교 ↔ 가정’을 잇는 선교적 교회학교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은 중·고등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를 개척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사역을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 학원복음화 비전과 전략을 공유해 지역교회가 중심이 되어 기독교 동아리 사역을 펼쳐가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부는 복음을 전하는 체질로 개선되어 내적으로는 역동성을, 외적으로는 전도와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학부모기도회와 기독교사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유·초·중·고·대·군대에 이르기까지 영적 사다리가 만들어지며 건강한 선교적 교회학교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운동을 접목한 지역교회를 통해 전국 300여 곳의 중·고등학교에 기독교동아리가 세워졌다.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운동 모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교회, 단체들의 사례가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교회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580만 명이 있는 학교로 찾아가 복음을 전한다면 교회학교는 회복되고 부흥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새롬 목사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