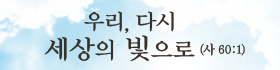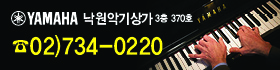외세의 침략·침탈로 근대화의 필요성 절감
서당 폐교, 변신학교 설립해 근대 교육 시작
김병조(金秉祚) 목사는 한국교회사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목사이다. 더욱이 그가 3·1 독립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조차 거의 없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평생토록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3·1 독립운동부터 임시정부에서까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독립운동가였다. 그는 목회자요, 독립운동가요, 사학자요, 교육자요, 언론인이었다.
평생을 독립운동과 항일운동에 헌신했던 김병조 목사는 해방이 되자 모든 교역자가 줄지어 남하해 이북 교회는 목자 없는 교회로 변하는 상황에서도 남하를 권유하는 이들에게, “내 나이 70에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남하하겠소. 죽는 날까지 목자 없는 양을 지키겠소” 하며 남아서 정주군 바산면 청정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다.
김병조 목사는 1877년 1월 10일 평북 정주군 동주면 복명동에서 김경복(金京福)의 3남 중 2남으로 출생했다. 이곳에서 10대를 농업에 종사하며 집안이 매우 가난했음에도 어려서부터 재질이 뛰어나 6세부터 서당에 보내 한학(漢學)을 공부하게 되었다. 사서삼경(四書三經), 제자백가(諸子百家)를 통달한 그는 마을 군수의 천거로 18세 때 궁궐 찰방(察訪)으로 임명되었으나 그는 학문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 사양했다.
개항 이후 외세의 침략과 침탈 앞에 무방비 상태로 내던져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보면서 근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특히 그가 태어난 정주는 1811년 홍경래 난의 중심지였고, 또 중국을 거쳐오던 서구 문물의 수입 근거지였다. 그래서 일찍부터 근대화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다른 지방보다 먼저 기독교가 전파되고 신식 학교가 들어선 것도 이런 까닭이었다.
1897년 19세에 그는 고향에서 80여 리 떨어진 평북 구성군 관서면 조악동에 서당을 차려서 교육에 종사하다가 1899년 22세에 조악동 하숙집 주인의 맏딸 최윤조와 혼인했다. 그 후 관서면보다 일찍 개화된 방현면으로 옮겨 서당 삼희재(三希齋)의 훈장으로 초빙되면서 변산학교로 개편했다.
김병조의 고향 정주는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 러일전쟁 전후 경의선 철도가 지나갔다. 애국계몽의 교육사업에서도 정주는 앞서갔는데, 민족교육의 요람인 오산학교가 세워진 것이 1907년이며, 이외에 정주 지역에 사립학교들이 세워진 시기도 1906년에서 1909년 사이였다. 1901년 25세 때 상투를 자르고 구성군 방현면에 변산학교(辨山學校)를 설립하고 1908년 기독교 학교를 인수하고 교장이 되었다. 그가 한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이러한 시대적, 지역적 분위기에서 떨어져 있지 않았다. 외세를 막고 민족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사회 근대화가 필수적임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다. 그의 이 같은 생각은 1903년부터 구체화되었다. 그것이 변산학교의 설립이었다.
1908년 서당을 폐교하고 변산학교를 설립해 근대식 교육을 했다. 망국의 원인이 퇴락한 유교 사상과 국민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긴 그가 서북학회와 대한협회 등 애국계몽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개화기 서북지방은 한국 개신교 역사의 전초기지로 일찍부터 민족열과 개신교 신앙이 결합된 수많은 신앙 인물들이 배출된 지역이었다. 김병조가 신식 학교를 시작한 구성군은 1895년에 김병조의 먼 친척인 김이련, 김관근 부자가 사기면 향산동에 초가 예배당을 세운 것으로 시작해서 1904년 방현면 하단동 남시(南市)에 두 번째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어 1905년 구성면에 구성읍교회가, 광산이 많던 이현면에는 길상교회가 연이어 세워지는 등 개신교 복음이 퍼졌다.
이승하 목사<해방교회 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