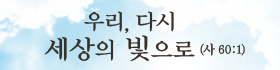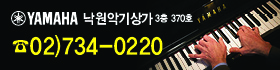올리버 R. 에비슨
에비슨은 영국에서 태어나 캐나다로 이주해 약학과 의학을 전공했다. 토론토 YMCA에서 의료선교 활동을 하던 중, 훗날 한국 선교사가 된 게일과 하디를 만나 교제했다.
1892년경, 언더우드가 안식년을 맞아 미국, 캐나다, 영국 등지를 방문하던 중 에비슨은 언더우드의 선교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 언더우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언더우드는 에비슨에게 조선으로 오지 않겠느냐며 선교사로 초청하게 된다.
사실 에비슨은 캐나다 감리교회 선교사로 파송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언더우드를 통해 그를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보내셨다. 에비슨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중원 원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했다. 제중원을 맡고 보니, 제중원은 조선 정부와 선교 본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조선 관리들의 부실한 운영과 전횡 등으로 인해 문제가 드러나고 있었다. 에비슨의 노력으로 제중원은 1894년 9월, 조선 정부로부터 독립해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소속 의료기관으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제중원은 선교부 전통을 잇는 세브란스로, 정부 전통을 잇는 서울대병원으로 분립하게 된다.)
이 무렵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전 세계적으로 콜레라가 창궐하고 있었다. 조선은 의료 상식이 부족해 콜레라를 ‘쥐 귀신이 사람을 공격한 것’이라고 여기며, 고양이 그림을 집 대문에 걸거나 몸에 지니고 다녔다. 이때 에비슨은 정부로부터 방역 책임자로 위임받아, 음식을 끓여 먹고 손발을 깨끗이 씻으며, 소금으로 양치질을 하도록 안내해 선선한 날씨와 더불어 콜레라 확산을 진정시켰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염병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선교사들의 모습, 그리고 무어 선교사의 부탁으로 왕의 주치의였던 에비슨이 콜레라에 걸린 백정 박성춘을 치료하는 장면을 보며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선교사들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바로 이 무렵,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일본인들의 칼 앞에 황후가 시해되고, 세자의 상투가 잘리며, 임금이 짓밟히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고, 고종은 수치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때 권총을 차고 임금을 호위하던 이들이 바로 언더우드, 에비슨, 헐버트 선교사였다.
에비슨은 미국 사업가 세브란스의 헌금으로 세브란스병원을 남대문 밖 복숭아골(현 서울역 건너편)에 건축하고, 「세브란스병원 의학교」를 설립하는 등 한국 근대 고등교육의 아버지 역할을 했다. 그는 여러 난관과 반대를 뚫고 연희전문학교(경신학교 대학부)와 세브란스병원 의학교를 병합해 지금의 연세대학교(종합대학)로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했다. 물론 에비슨의 노력은 1957년에야 연세대학교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에비슨은 제주에서 건너온 중환자 김재원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고, 김재원은 제주에서 평신도 전도인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김재원은 에비슨에게 제주에도 선교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평양신학교 첫 졸업생 중 한 명인 이기풍이 자원해 제주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당시 많은 선교사들이 정교분리 원칙을 이유로 한국의 독립운동 지원을 주저하고 있을 때, 에비슨은 “지금 한국교회는 신사참배 없이 정상적인 예배도 드릴 수가 없다. 한국이 독립되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에는 ‘세브란스의 영원한 스승’ 에비슨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에비슨은 1956년, 96세의 나이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별세했고, 사랑하는 아들 더글라스 에비슨이 묻혀 있는 양화진에 기념비와 함께 안장되었다. (더글라스는 에비슨의 열 자녀 중 넷째로, 의료선교사가 되어 세브란스병원 원장으로 봉사했다.)
류영모 목사
<한소망교회•제 106회 총회장•제 5회 한교총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