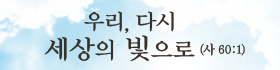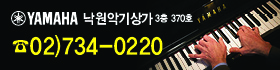오원 선교사의 희생 기리는 ‘오원기념각’ 건립
오원 선교사는 1867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출생했다. 세 살 때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됐지만 그의 할아버지의 뜨거운 신앙 안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았다. 그리스도처럼 남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고 신앙이었다.
그는 열성적인 할아버지 덕분에 햄던시스네대학과 버지니아대학을 졸업한 후 그의 할아버지의 고향인 스코틀랜드에서 2년간 교육을 받고 귀국했다.
그는 또한 리치먼드유니언신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모교인 버지니아대학 의학부에 진학해 그곳에서 의술을 연마했다.
미국을 떠난 오원 선교사는 여러 날을 거쳐 드디어 1898년 11월에 그의 목적지인 목포에 도착해 배유지 선교사의 좋은 협력자가 되었다.
오원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로 목포에 부임했는데 보람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당시 목포와 무안 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은 바다에서 잡아온 복을 제대로 먹을 줄을 몰라 잘못 먹어 생명을 잃기도 했다.
어느 날 젊은 두 청년이 어머니가 만들어 준 복을 먹고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이에 놀란 어머니가 서양 선교사를 찾아가면 낫는다는 이웃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들을 들것에 싣고 오원 선교사에게로 찾아왔다.
“미국 아저씨, 복을 먹고 우리 아들들이 지금 중태에 빠졌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아저씨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오원 선교사는 그 여인의 얼굴을 보고 아들들이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음을 금방 알았다. 오원 선교사는 통역원의 협조를 얻어서 주사를 놓고 며칠 먹을 수 있는 약을 제조해 주었다.
아주머니의 두 아들은 살아났고 목포교회에 출석을 하는 훌륭한 교인이 되었다. 이 소문이 좁은 목포 바닥에 쫙 퍼지게 되었고, 심지어 무안 지방뿐만 아니라 목포선교부에서 관장하고 있던 인근 모든 읍내에까지 알려졌다.
목포 선교에는 배유지 선교사, 우원 선교사, 여기에 부녀자들을 상대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스트레퍼 여선교사(한국명 : 서부인)까지 합세하자 목포교회와 목포선교부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성공리에 사역에 임했던 배유지 선교사와 오원 선교사는 목포에 거주하면서 전남 광나루, 장성, 광주 지방에까지 선교의 영역을 넓혔다. 그런데 1904년 4월경에 광주 인근에 있는 하나말교회와 영신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이러한 일을 종종 당했다. 배유지 선교사와 오원 선교사는 보다 효율적으로 내륙 지방의 선교 사역을 하고 지방 관리들과 자주 접촉하기 위해 전라남도의 중심지인 광주에 선교부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1904년 12월 19일 광주로 옮겼다.
광주에 선교부가 설치되자 오원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로서의 활동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이러한 열정으로 그는 목포에 있는 목포교회를 비롯해서 송정리교회, 해난 선두리교회, 보성 신천리교회, 율곡교회, 양동교회, 운림리교회, 광주교회, 완도 관산리교회, 나주 내산리교회, 방산리교회, 장흥 진목리교회, 고흥 옥하리교회, 화순 화순읍교회, 광양 광양읍교회 외에도 15개처나 개척했다.
그런데 오원 선교사는 과로와 급성폐렴으로 광주에 온 지 3일만인 1909년 4월 3일 32세의 아까운 나이에 요절했다.
그의 부인인 휘팅 오원은 자신의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정성껏 간호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끝내는 목포진료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의사 의료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늦게 도착한 관계로 그만 생명을 연장하지 못했다.
그의 부인 휘팅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회의 선교사로 서울에서 활동하던 중에 동료 선교사들의 중매로 오원 선교사를 만나 결혼해 목포와 광주에서 의사로서 남편의 사역을 도왔다. 그런데 그의 남편 오원 의료 선교사는 네 자녀를 남겨 놓고 먼저 떠나 버렸다.
그후 그녀는 네 자매를 모두 훌륭하게 키우고 1923년 한국의 선교 사역을 끝내고 귀국했으며, 다시 한국으로 나오지 못하고 1952년 한국 하늘을 바라보면서 남편 곁으로 떠났다.
한편 오원 선교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미국 남장로교회에 알려졌다. 그런데 오원 선교사가 광주에 큰 회관을 세웠으면 하던 생각을 갖고 그의 큰아버지에게 몇 차례 서신을 보낸 일이 있었다. 이에 그의 큰아버지는 비록 조카 오원 선교사가 사망했지만 그가 소원하던 대로 각종 사경회의 모임 장소로 쓸 수 있는 큰 회관을 짓도록 3천 달러를 송금해 왔다.
이 소식이 전 미국에 알려지자 여기저기서 헌금이 모아졌으며, 이 헌금을 모아서 숭일학교 캠퍼스 내에 강당을 건축하기로 했다. 강당 건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1914년, 건물을 완성하고 이를 ‘오원기념각’이라 이름을 붙였다.
이 오원기념각에서는 사경회는 물론 강연회, 음악회, 가극, 무용, 연극 등 각종 문화행사가 열려 광주 시민들의 문화관처럼 사용되었다.
오원기념각이 문을 열자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었는데, 그중 숭일학교 학생들이 아침 채플강당으로 사용해 이곳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민족과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한편 한국 영계의 거성으로 알려진 길선주 목사도 이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했고, 민립대학의 건립 문제로 이갑성도 다녀갔다.
또한 음악회가 열리면 으레 숭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 두 학교의 남녀 학생들이 위아래층을 가득 메우고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그리고 매년 성탄절 예배 때도 두 학교가 공히 오원기념각을 사용하기도 했다.
광주 수피아여학교와 선교사들
배유지 선교사와 광주 수피아여학교
배유지 선교사와 오원 선교사 가족. 이들을 돕는 목포교회 교인 김윤수 집사 가족이 광주 양림리에 자리를 정하고, 그 해 성탄절을 맞이해서 광주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광주교회의 시작이었으며, 한편 배유지 선교사는 그의 사랑방에서 교인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실시했다.
안영로 목사
· 90회 증경총회장
· 광주서남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