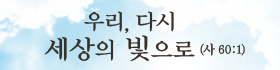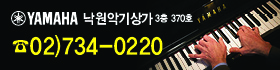중국은 저출생으로 2022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후 중국의 출산정책은 다섯 단계로 변화했다. 49년부터 53년까지 출산 장려, 54년부터 77년까지 완만한 산아제한, 78년부터 2013년까지 엄격한 출산 억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완화된 가족계획, 2021년 이후 출산 지원 등으로 바뀌었다.
마오쩌둥은 ‘사람이 많아야 국력이 강해진다’는 신념에서 출산을 독려했다. 49년에 5억 4천만 명이던 인구가 53년에 6억 명을 넘으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완만한 산아제한 정책을 폈다. 54년부터 77년까지 시행한 산아제한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증가해서 74년에 9억 명을 돌파했다.
중국 정부는 강력한 억제 정책을 도입했다. 78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계획생육정책(計劃生育政策)이다. 2002년 9월 1일에 ‘인구계획생육법’으로 법제화하고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벌금을 부과하고, 둘째는 호적에 올리지 못하게 했다. 한 자녀 정책으로 증가가 둔화되었다. 82년에 10억 명을 넘어선 뒤 6년 만에 11억 명이 되었는데, 12억 명은 7년, 13억 명은 10년이 걸렸고, 14억 명이 되는데 14년이 걸렸다.
계획생육정책(計劃生育政策)은 사상 최대의 인구 조절 정책이다. 인구억제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지만, 대륙의 스케일과 중국공산당의 강력한 캠페인으로 해악이 컸다. 불법 낙태, 강제 불임 시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헤이하이즈(黑孩子, 흑해자) 증가, 여아 학대와 살해, 영아 유기, 남녀성비의 극단적인 불균형, ‘소황제’ 세대 등장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중국 정부는 출생률이 감소하자 2015년에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했다. 2021년 5월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세 자녀를 허용하고, 그해 8월에 ‘인구 및 가족계획법’으로 법제화했다. 이로써 중국은 산아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했다.
중국의 출산율은 93년을 기점으로 대체 수준 밑으로 내려갔다. 2020년에는 합계출산율 1.28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생국이 되었다. 2025년에는 전국 육아수당을 신설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했다. 지방정부도 보조금 지급, 청약가점 부여, 세금 면제 등으로 경쟁적으로 출산을 장려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매 10년마다 시행하는 ‘전국 인구 대조사’에서 인구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5차 조사에서 12억 9천533만 명이던 인구가 2010년 6차 조사에서 13억 3천972만 명(4천439만 명, 3.4% 증가)이 되고, 2020년 7차 조사에서 14억 1천178만 명(7천206만 명, 5.4% 증가)이 되었다.
2022년부터 61년 만에 중국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1년 말 14억 1천230만 명이던 인구가 2022년 말 14억 1천175만 명(85만 명 감소)이 되고, 2023년 말 14억 967만 명(208만 명 감소), 2024년 말 14억 828만 명(139만 명 감소)으로 감소했다. 40년 이상 시행한 정책으로 ‘한 자녀면 충분하다’는 사회 분위기와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저출산 현상,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로 중국의 출산 장려 정책은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붙인 관세전쟁으로 미중간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무역과 경제질서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중진국 대열에 들어선 중국은 안팎의 도전을 맞이했다. 시진핑 체제에 대한 정치적 도전과 함께 인구 감소 대응도 만만치 않다. 한국도 두 나라 사이의 경쟁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한국교회도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는 양국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라면서 주목하게 된다.
변창배 목사
전 총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