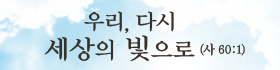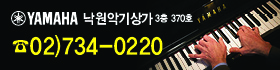옛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조선시대에 어느 임금님이 한양을 떠나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개성 근교에 살던 한 할머니가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즉, “내가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 있어서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임금님의 용안(龍顔)을 멀리서라도 뵐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임금님이 오시는 그날만을 기다렸다가 50리나 되는 먼 길을 어머니를 업고 찾아가서 임금님이 지나갈 때, 잘 보시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임금님이 그 아들을 불러 “참으로 효자로다!” 칭찬하며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하사(下賜)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동네의 한 불효자가 자기도 상을 받고 싶어서 원치도 않는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효자를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신하가 임금님에게 이러한 사실을 낱낱이 고하며 “불효자에게는 ‘상(賞)’이 아니라 ‘벌(罰)’을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니 똑같은 상을 주어라”고 하고 같은 상을 내렸습니다. 과분한 상을 받은 그 불효자는 결국 정성을 다하는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흉내를 내서 해도 좋은 것입니다. 효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혹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못해도 사랑합니다. 효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서는 죄수에게 일정기간 동안 길거리 청소를 하게 했답니다. 어느 날 수상(首相)이 관저(官邸)에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옷을 말끔히 차려 입은 한 청년이 눈을 쓸고 있는 죄수에게 다가가서는 꾀죄죄한 죄수를 끌어안고 그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수상은 궁금히 여겨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가 손에 입을 맞춘 그 죄수가 누구인가?”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각하, 그 사람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 청년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뜻밖의 사실에 할 말을 잃은 수상은 죄수가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 아들을 두었을까?’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상은 국왕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자식을 잘 기른 아버지는 나쁜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수는 특별 사면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효도는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엡6:1~2)』ㅡ 우리가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하던 성경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었고 다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위한 계명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첫 계명이 바로 다섯 번째 되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효(孝)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효’의 대표적인 인물로 구약 룻기에 나오는 며느리 ‘룻’을 떠올리게 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섬겼던 모압의 이방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의 뜻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는 성서적 인물이 되는 축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는 5월 둘째 주에 《어버이날》을 맞았습니다. ‘코로나’는 많이 가라앉아 한 숨 돌렸지만 이상한 독감이 유행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외출할 때 마스크를 씁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다시 한 번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양주동 선생께서 노랫말을 지으시고 이흥렬 선생께서 곡을 붙이신 《어머니의 마음》의 노래는 언제 불러도 그 노랫말이 눈물을 핑 돌게 합니다. 지금 다시 그 노래를 불러봅니다. “낳으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 어머님의 희생은 가이 없어라.”
문정일 장로
<대전성지교회•목원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