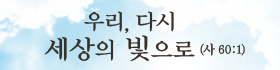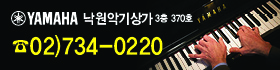널찍한 냄비에 청국장을 끓여 밥상 한가운데에 놓고 식구끼리 같이 떠먹는 모습을 바라본 한 외국인 사진작가가 위생관리가 안된 민족이라 했다지만 누가 뭐래도 정말로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식구(食口)’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민족의 유산이자 전통적 개념입니다. 오늘날 진정 옛날과 같은 ‘가족애’를 느끼며 살아가는 ‘식구’란 게 있기는 할까요? 가슴을 따뜻하게 적시는 우리의 단어 ‘식구’가 그립고,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가족은 영어로 패밀리(family)입니다. 노예와 하인을 포함해서 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하는 라틴어 ‘파밀리아(familia)’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일가(一家)’라는 말을, 일본은 ‘가족(家族)’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 지붕 밑에 모여 사는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식구(食口)’라는 말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직역하면 “같이 밥 먹는 입”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에게는 「가족」이란 한 솥 밥을 먹는 「식사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우리 식구」란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한 집에 살아도 한 상(床)에서 밥을 먹지 않거나, 식사를 할 기회가 없다면 엄밀히 말해서, ‘핏줄’이기는 해도 ‘식구’랄 수는 없습니다. 최근 한국 가정의 위기가 심각해 지고 있는 것은, 가족 간에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풍조가 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몇 년 전 뉴스에 나온, 고된 이민 생활 속에서도 6남매를 모두 예일대와 하버드대 등 명문대학에 보내서 최고 엘리트로 키운 한국인 어머니 ‘전혜성’ 여사도, 자녀 교육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식사는 가족이 함께 했다며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요즈음, 우리 생활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식구가 얼굴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밥상머리’뿐인데 오늘 날,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온 식구가 한 밥상에서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출근시간, 자식의 등교시간이 다르다보니, 각자 일어나자마자 허둥지둥,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또는 우유 한잔 서서 마시고 나가기 일쑤고, 저녁 귀가시간도 각자 달라 한 식탁에서 저녁식사를 하기는커녕, 언제 귀가 했는지 서로 모르고 각자 방에서 잠자기 바쁩니다. 이러한 일상의 연속이니 ‘밥상머리 교육’은 고사하고, 어떤 때는 며칠간 얼굴 못 볼 때도 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늦게 귀가하는 식구를 위해, 아랫목 이불 속에 밥을 묻어 두곤 했습니다. ‘밥의 온도’는 곧 ‘사랑의 온도’였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어머니는 뜨끈한 국과 따뜻한 밥을 챙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전기밥솥이 그 자리에 대신 놓여있고, 라면 등 인스턴트 제품이 집집마다 있어 필요할 때면, 밤중에라도 각자 알아서 허기(虛飢)를 해결하게끔, 너무도 친절하게(?)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밤늦게 들어와 아내에게 밥상 차리라고 했다간 이 시간까지 밥도 못 먹고 어딜 돌아 다녔느냐고 핀잔 듣기 십상이고, 부엌에 라면 있으니 끓여 먹으라는 말을 듣기 십상입니다. 느닷없이 소낙비가 쏟아지는 밤, 버스 정류장에는 우산을 받쳐 들고 언제 올 지도 모르는 ‘식구’를 기다리는 그 정겨운 모습들을 요사이는 좀처럼 볼 수가 없지요.
요즈음에는 대부분의 주부들이 나름대로 직장과 할 일이 있으니, 충분히 이해 할 수가 있다 해도 현실이 너무 메마른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가장의 위압적인 언사(言辭) 때문에 아내와 자식이 상처 받는다고 했지만, 오늘날의 아버지는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는 직업 형편상 귀가하는 시간이 대체로 늦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가장을 기다리다가 먼저 잠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밥상머리 교육이나 대화는 기대하기 힘들고 집안 분위기도 냉각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주 부르는 찬송이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입니다. 이 찬송은 서양인의 작품이 아니라, 전영택(田榮澤, 1894~1968) 선생이 노랫말을 짓고 구두회(具斗會, 1921~2018) 선생이 곡을 붙인 찬송입니다. 특히 3절 가사를 떠올려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매우 친근하고 따뜻한 한국문화가 서려있는 찬송입니다.
문정일 장로
<대전성지교회•목원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