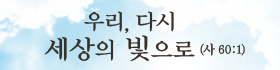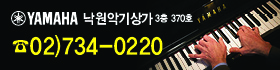타마자 선교사와 아들 타요한 선교사, 한국 사랑과 헌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타마자 선교사
어느 날 난데없이 담양경찰서 안에는 담양성경학교 출신 전도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일경들이 이들이 신사참배 및 동방요배를 하지 않았다 해 모두 구속했던 것이다. 이 일로 타마자 선교사도 자연히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자신은 이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뒤에서 조종한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돌아왔다. 그러나 전도사들은 계속 담양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었으며, 광주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1937년에는 호남에 있는 미션학교가 다 문을 닫고 일부 선교사는 강제 출국을 당했다. 그러나 타마자 선교사는 선교부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며 남아 광주에는 부인과 유화례 선교사, 닷슨(Miss M. L. Dodson) 선교사 이렇게 네 명만 남게 되었다.
이미 유화례 선교사는 수피아여학교의 교장직을 사퇴한 후여서 불쌍한 나환자들을 돕기 위해 여천 애양원에 가서 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제는 광주 양림동 동산에 있는 선교사의 주택 및 병원, 학교 등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타마자 선교사를 위협했다.
당시 타마자 선교사는 한국에 있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었다. 그는 원래 한국어는 물론 그 까다로운 한자까지 습득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일본어까지 배워 두었기에 재산목록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었다.
결국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버티던 타마자와 그 외 다른 선교사들은 1942년 6월에 강제 출국을 당해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유화례 선교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필자의 저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어」 제9부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후 해방을 맞아 타마자 선교사 부부는 정든 땅 광주로 다시 돌아왔다. 이미 그가 광주에 오기 전에 광주 숭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가 동문들에 의해 재건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본 타마자 선교사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모두 이루어져 간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는 한국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끌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1949년 광주에 미션대학을 설립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전쟁으로 이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1954년 재론되었는데, 전주에서 활동하던 인돈 선교사는 전주에 대학을 세우자고 강력히 주장했다면 전남 지방에서 더 많은 기독교 지도자가 배출되었으리라는 아쉬움을 갖게 된다.
타마자 선교사는 1955년 65세 45년 간의 선교사직을 은퇴하고 귀국했다. 그는 광주 지방 및 담당 지역 사람들, 아니 한국 교회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한때 교장으로 재직했던 광주 숭일고등학교 출신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담양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신사참배는 우상이라 해 평양신학교를 자퇴했던 김용선, 박동완, 조용택, 김재택은 모두 낙향해 일제와 싸우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해방 후 타마자 선교사와의 기쁜 재회는 잠깐이었다. 한국 전쟁으로 김용선, 조용택, 김재택은 모두 인민군에 의해 순교를 했으며, 박동완 전도사는 후에 장로가 되어 전남 지방에서 많은 수고를 하다가 7~8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정년으로 은퇴했던 타마자 선교사는 부인과 같이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부인은 1962년에 생을 마감했으며, 타마자 선교사는 2년 후인 1964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동안 한국에서 출생했던 그의 자녀 7남매는 모두 장성해 부모가 다 하지 못했던 선교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자녀 중 한 사람은 대학교수로, 세 사람은 선교사로, 한 사람은 미국에서 목사로, 또 한 사람은 라디오를 연구하는 공학도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둘째로 태어난 에드워드 (John Edward, 한국명 타요한, 이하 타요한으로 표기) 선교사는 대전대학 제2대 학장으로 재직했으며,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부 총무직을 맡은 적도 있었다.
타요한 선교사와 대전대학
2대째 한국 선교에 참여했던 타요한(1912~ ) 선교사는 광주에서 태어났다. 부모의 슬하에서 청교도 교육을 받았던 그는 1934년 미국 메리빌리대학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했으며, 1936년에 콜롬비아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 후 내한해 1937년 부인과 함께 군산에서 활동했으나, 일제의 강제 출국으로 부모를 광주에 놔둔 채 1939년 출국했다.
해방이 되자 다시 군산선교부에 귀임했으며,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군산 영명학교 제건에 힘을 쏟았다.
이미 군산 영명학교의 관현악단은 전북 서남지방에서는 익히 알려져 있었다. 일제 강점기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부위렴 선교사는 주말이 되면 관현악단을 인솔해서 노방전도 및 천막전도를 나가기도 했다.
군산 영명학교가 재건되자 흩어져 있던 학생들을 다시 모으고 악기를 구입해서 영명학교 관현악단의 전통을 살리고자 했다. 그 후 목포고등성경학교 교장으로 잠시 활동하다가 1960년 일시 도미해 콜롬비아신학교에서 신학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곧 대전대학 제2대 학장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인돈 선교사의 대를 이어서 대학다운 대학을 만드는 데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1965년에는 벧하인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부에서 총무로 활동하다가 1977년에 은퇴해 귀국했다.
타요한 선교사는 한국 전쟁시 잠시 부산으로 피신했다가 전쟁의 종결을 위해 기도하던 중 1953년에 도일해 일본 관서 지방에 있는 한인교회를 순회하면서 선교사역을 감당한 일도 있으며 안정이 되자 1956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노라복 선교사와 광주선교부
광주 숭일학교 제2대와 제4대 교장을 역임했던 노라복 선교사는 1907년에 내한해 목포선교부에서 복음 전파에 많은 공을 세운 선교사이다. 그는 4년간 목포 선교활동을 정리하고 1911년 광주선교부로 이적하면서 광주 숭일학교에서 사역했다.
노라복 선교사는 1880년 텍사스 주에서 아버지 윌리엄 알렉산더 녹스와 어머니 사라 엘리자베스 윌리엄 사이에서 출생했다. 1897년 어스틴칼리지에 입학해 2년 과정을 이수하고 1903년 문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프린스턴대학 대학원에서 1년 만에 문학석사 학위를 받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프린스턴신학교에서 2년 간의 수업을 받았다. 때마침 미국 남장로교 해외선교부에서 한국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1907년 부인과 함께 내한해 첫 부임지 목포선교부에서 활동했다.
이미 목포선교부는 자리가 잡혀 있어서 선배 선교사들의 뒤를 이어 농촌 선교에 임했다. 때마침 변요한 선교사가 광주로 이거해 가자 그가 활동하던 해남 지방의 교회를 관리하면서 전도사역에 임했다. 변요한 선교사가 순천선교부로 이거해 가자 광주선교부로 이거해 가서 숭일학교 제2대 교장으로 취임했다.
안영로 목사
· 90회 증경총회장
· 광주서남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