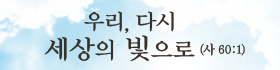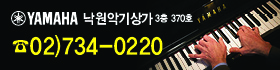80이 가까운 한 노인이 평생 동안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나머지 생애에는 느긋하게 돈 쓸 일만 남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잠이 들었다가 영영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 순간, 잠에서 깨어나면서 “여기가 어디지? 내 집이 아닌 거 같은데~”
무섭고 험상궂게 생긴 염라대왕이 말했다. “여기는 저승이다.” “뭣이라? 저승? 난 아직 저승에 올 때가 안 됐는데~” 노인은 염라대왕에게 눈물로 애걸복걸 하소연한다. “염라대왕님, 소인은 자다가 그만 여기에 왔는가 본데 예정에 없던 일입니다. 하오니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염라대왕이 대답한다. “그것도 너의 운명이니라.” “아이구, 염라대왕님! 운명이고 나발이고 가족과 고별 인사할 시간도 없었고 재산 정리도 못했습니다. 얼떨결에 왔나 봅니다. 실수인 듯하오니 취소시켜 주십시오. 벌어놓은 돈이라도 좀 쓰고 올 수 있도록 딱 일년만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시오. 돈을 벌게 했으면 쓸 시간도 주어야지 얍삽하게 자는 사람을 데려오다니 이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다섯 번이나 돈 쓸 기회도 주지 않았더냐?” “언제요? 언제 눈치, 코치라도 주셨나요?” “니 말대로 눈치, 코치 줄 때마다 너는 이게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스스로 자꾸 변장술(變裝術)만 시도하지 않았느냐?” “그게 뭔데요? 언제요?”
“첫 번째는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니 일찍부터 준비하라고 너의 검은 머리를 흰색으로 신호를 주지 않았더냐? 그랬더니 너는 까만색으로 ‘먹칠’을 해대더구나! 두 번째는 니 시력이 나빠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도록 만드니까 ‘안경’이니 ‘콘택’이니 변장해서 젊은 척만 하더구나! 세 번째는 좀 덜 먹고 몸도 줄여서 세상살이 끝날 날을 대비하라고 치아(齒牙)를 흔들거리게 했더니 너는 ‘임플란트’니 ‘틀니’니 하면서 또 나를 속이더구나! 네 번째는 무릎이 아프면 걷지도 못 하느니라, 하고 관절을 아프게 했더니 ‘인공관절’이란 걸로 또 변장을 하더구나!”
대왕 왈~ “이렇게 확실하게 눈치도 주고 코치도 주었는데도 무엇이 그리 억울하냐?” 노인 왈 “억울하다 마다요! 그런 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하는 유행입니다. 유행이에요~ 대왕께서도 쫀쫀하게 뭘 그런 것 갖고 따지십니까?”
대왕 왈~ “다섯 번째는 너의 체력이 달려서 젊을 때보다 일하는 데 힘이 들지 않더냐? 그건 죽을 날이 문 앞에 온 줄 알라고 경고했지만 너는 ‘영양제’니 ‘보약’이니 하는 걸로 또 ‘수명연장’만을 노리더구나.” “아니 대왕님 그런 건 확실하게 구두(口頭)로 말씀해주셔야지, 소인이 그걸 어찌 다 알 수가 있나요? 그나저나 자는 사람을 끌고 오는 방법은 너무 비겁하고 치사하지 않나요?” 염라대왕 왈~ “그럼 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운 일은 있느냐?” “없습니다. 가난한 인간들은 게으른 탓인데 그런 인간들을 왜 도와 줍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돈도 자신을 위해 쓴 돈으로 인정해 주련만 너는 그런 것도 하나 없구나! 너는 ‘소처럼’ 일했지만 ‘돼지처럼’ 살았구나!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떠는 ‘소인배’로 살았으면서도 무신(?) 이유가 그리 많으냐? 자기 잘못을 대왕한테 떠넘기는 배짱 좋고 뻔뻔스런 놈은 또 처음이구나! 너는 일하는 걸 좋아했으니 저승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황소가 되어 살거라!” 그러자 노인 왈~ “아이구, 아까워라! 내 돈! 내 돈! 뼈 빠지게 버느라고 고생만 했는데! 100만 원짜리 옷도 한번 못 입어보고 해외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아이구, 억울해라!”
사람이 늙어가면서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은 ①노욕(老慾)→ ②노탐(老貪)→ ③노추(老醜)→ ④노망(老妄)의 4단계로 점차 추(醜)해지므로 옛 선현(先賢)들은 이런 ‘노욕’을 극히 경계했다고 한다.
조선 후기의 명필(名筆)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가 71세 때, 병중(病中)에 썼다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奉恩寺)의 현판 ‘板殿(판전)’은 각각의 획이 마치 뭉뚝뭉뚝한 막대기를 이어 붙인 듯 서체(書體)의 격(格)이 떨어져 추사의 글씨답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한 유명 서예가는 서평(書評)에서 “아무런 기교도 부리지 않고 무심하게 써 내려간 글씨에서 추사의 욕심 없는 순수함을 본다”는 글을 읽고 새삼 추사의 ‘무욕(無慾)’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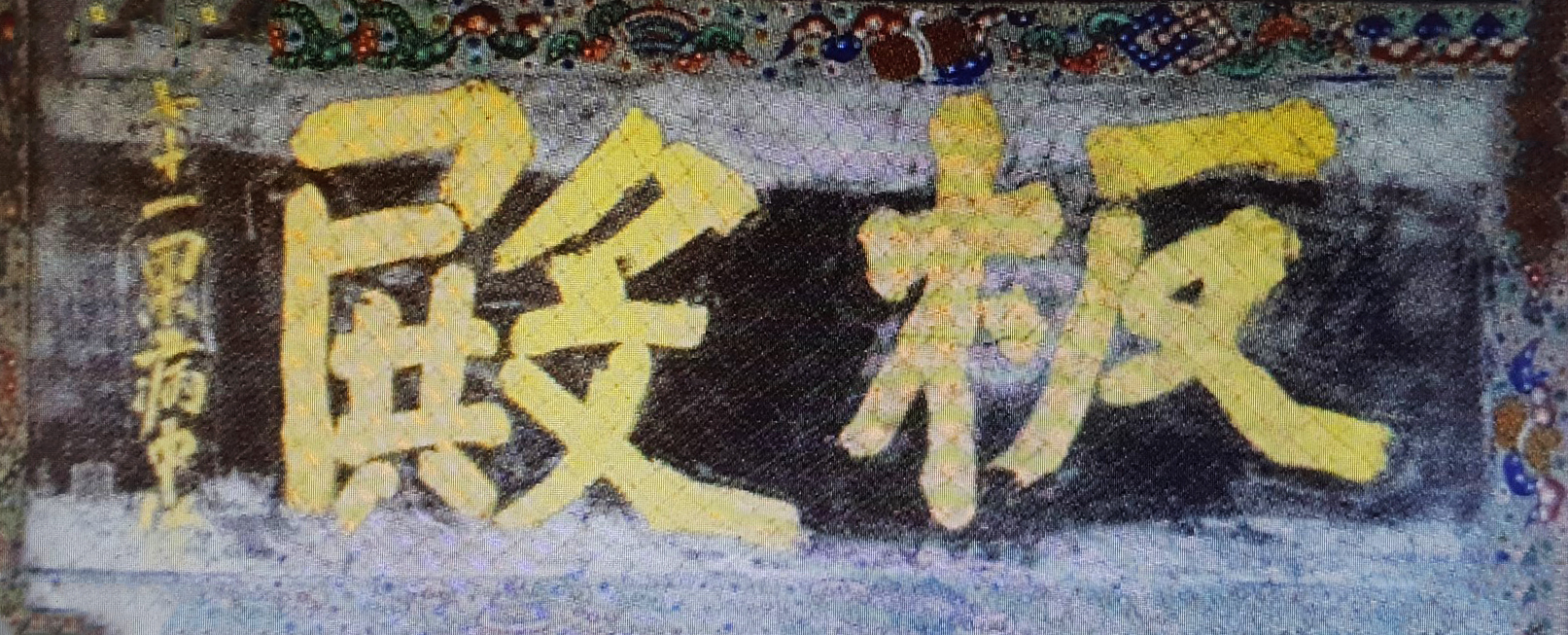
문정일 장로
<대전성지교회•목원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