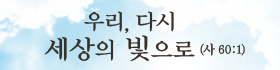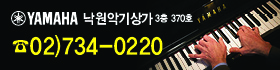세계 제1차 대전 후 민족운동 활로 모색
거국운동에 기독교민족대표로 동참 결의
김병조의 5년 신학교 재학 시기는 그의 인생에서 인적, 사상적 기반이 형성되는 전환기였다. 이 기간에 그는 남강 이승훈을 비롯해 유여대, 강규찬, 김경덕, 김규찬, 배은희, 윤하영, 김인전, 송병조, 장덕로, 선우훈, 변인서, 함태영, 김승만, 이명룡 등 기독교 민족운동 관계 인물들과 깊이 교제했다. 특히 ‘105인 사건’으로 투옥된 지 6년 만에 가출옥한 뒤 1916년 3월 평양신학교에 입학한 이승훈과의 만남은 기독교 신앙과 민족운동의 결합을 직접 터득할 기회가 되었고, 이외에도 송병조, 조상섭, 이원익 등과의 관계는 훗날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함태영을 제외하면 김병조는 대부분 서북 지역 기독교인들로부터 민족주의 신앙관을 내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제1차 대전 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 식민지 조선의 기독교인들도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민족운동의 활로를 모색했다. 1918년 신한청년당을 조직한 김규식, 서병호, 선우혁 등은 1919년 2월 2일 상해에 모여 김규식을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파견할 것을 결정하고 장덕수를 일본으로, 여운형을 노령으로, 선우혁과 김철, 서병호를 국내에 파견해 국내외 정치, 사회, 종교계를 망라한 거족적인 독립운동의 방법을 모색할 것을 계획했다. 국내로 파견된 선우혁은 2월 6일경 평북 선천의 양전백 목사를 찾아 방문 목적을 말했다.
“미국 대통령에 의해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자 민족자결의 소리는 유럽 각 민족 간에 일어나 지금은 세계 풍조가 되었다. 이 기회에 우리 조선 민족도 독립운동을 기도하면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해에 있는 교포들은 협의 끝에 김규식을 파리로 보낼 것을 결정했다. 이때 국내에서도 소리를 크게 높여 독립운동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파리 대표자에 대해서는 운동비를 모아 성원해 줄 필요가 있으니 이 일에 진력해 주기 바란다.”
선우혁은 이승훈과 동향인 평북 정주 출신으로, 민족대표 33인에 포함된 이명룡 장로의 사위 선우훈의 형이며 흥사단원이기도 했다. 선우혁으로부터 독립운동 계획과 후원금 문의를 받은 양전백은 평북 지역 기독교인들과 의논해 성사시키기로 약속했다. ‘105인 사건’으로 선우혁과 함께 투옥되었던 양전백 목사는 1916년에 장로교 총회장을 지낸 교계 지도자였다. 양전백 목사의 동의와 협조를 구한 선우혁은 다음날 고향인 정주로 가서 이승훈을 만나 평양과 서울의 교계 지도자들과 거국적인 독립운동의 방책을 구할 것을 논의했다.
김병조가 ‘민족대표 33인’에 참가한 경위는 이랬다. 선우혁과 논의한 이승훈은 1919년 2월 11일 서울에서 최남선, 송진우와 만나 독립운동에 기독교 측의 참가를 약속한 뒤 동지를 규합하기 위해 평북 선천으로 갔다. 마침 2월 12일은 제15회 평북노회가 선천 남교회당에서 개최되기 일주일 전으로, 전례대로 사경회가 먼저 열리고 있었다. 그 당시 김병조는 1918년 11월 27일 평북노회에서 분립한 의산노회 임원으로 김승만, 장덕로, 유여대 등 노회원들과 함께 사경회 기간에 노회 사무 인수를 위해 선천에 머물고 있었다.
2월 12일 밤 양전백의 집에서 의산노회 임원 4인(김승만, 유여대, 김병조, 장덕로)과 선천 북교회 백시찬 장로, 홍성익 장로 등은 거사에 동참할 동지를 구하려고 찾아온 이승훈과 만나게 되었다. 이 만남에서 이승훈은 서울에서 진행 중인 기독교계와 천도교계 지도자들의 독립운동 계획을 설명하고, 거국운동에 평북 지역 기독교인들의 참가를 독려했다.
이에 김병조를 포함해 양전백, 이명룡, 유여대 등 4인이 기독교 민족대표로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평북 지역 거사는 지역 분담으로 진행할 것과 김병조, 유여대, 김승만, 장덕로 등 4인이 의주, 삭주, 창성, 벽동 등 의산노회 관할 지역을 맡기로 정했다.
이승하 목사<해방교회 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