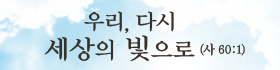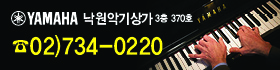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 B.C4~A.D.65)는 로마 제국 시대의 정치가, 철학자, 문학가로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네로 황제의 조언자로 활동했지만 후에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네로에게 자살을 명령받고 침착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세네카는 네로 황제가 폭군의 길을 걷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 <관용론>을 저술했다. 이 책은 이후 종교개혁자 칼뱅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1532년 칼뱅은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써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에게 보냈다.
이 주석서는 칼뱅의 법 이해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후 개혁신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칼뱅은 세네카의 관용 개념을 정치 윤리의 핵심 미덕으로 보았지만, 동시에 엄격한 정의를 강조했다. 그는 기독교 국가의 틀에서 신정 정치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고려해 관용과 정의 사이의 균형을 모색했다. 칼뱅의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 제2권 7장의 일부를 소개한다.
“관용은 결정에서 자유를 가집니다. 엄격한 법적 틀을 따르지는 않지만, 공정하고 선한 원칙과 일치합니다. 때로는 무죄 석방을 결정하고, 손해 배상을 가치에 따라 조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관용이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으며, 반드시 가장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용서는 처벌받아야 할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관용은 용서보다 더욱 완전하고 신뢰할 만한 개념으로 자리 잡습니다. 관용은 단순한 사면이 아니라, 사면받은 자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가치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 지혜 있는 자는 올바른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곧고 건강한 나무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구부러져 자란 나무가 다시 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버팀목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관용의 본질이며, 정의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할 윤리적 가치입니다.”
칼뱅은 관용을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공정성과 선함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판단으로 보았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용서가 아니라 관용의 의미이다. 한국교회에 용서는 넘쳐난다. 그러나 관용이 아닌 값싸고 헤픈 용서의 남발이 오히려 교회를 망치고 있다.
문성모 목사
<전 서울장신대 총장•한국찬송가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