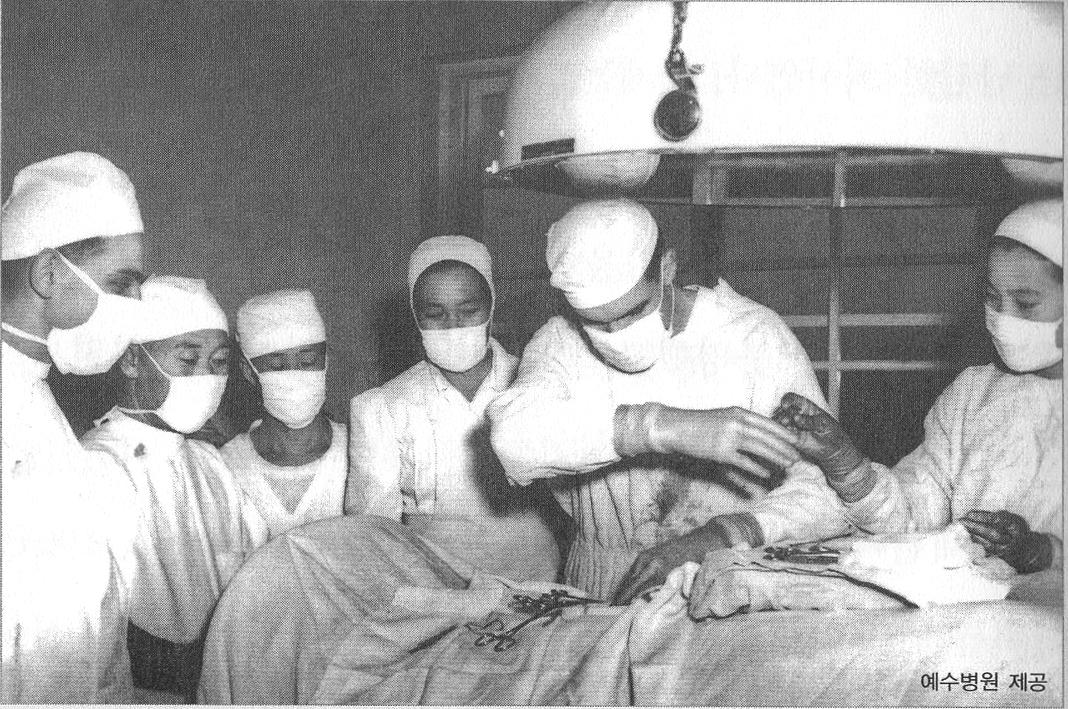1970년 초가을, 나는 전주와 광주에서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중에 베트남전(戰)에 지원해 총 4년간의 군 복무를 마친 후 예비역 소령으로 제대했다. 그리고 기도하고 소망했던 대로 강원도의 무의촌으로 갔다. 내가 찾아갔던 간성이라는 곳은 속초 북쪽에 위치한 바닷가 마을로, 작은 보건소가 있기는 하지만 무의촌이나 다름없었다.
연애할 때부터 “결혼하면 같이 가자”라고 약속한 무의촌에 정작 아내와 함께 가지 못했다. 아내는 한 병원에 근무 중이었고, 두 살 터울로 낳은 취학 전의 아들과 딸이 함께 살 집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간성의 정미소 한구석의 창고를 빌려 겨우 병원 문을 열었다. 가정집도 구하기 힘든 형편이었으니 병원으로 쓸 만한 건물은 더더욱 구하기 힘들었다. 진료실과 약제실, 수술실은 모두 합판으로 벽을 세워 구분해놓았다. 그리고 근처 가정집을 빌려 온돌에 이불 몇 장 깔아놓은 것이 병실이었다. 처음에는 나와 손발이 맞는 숙련된 간호사도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도 빈약했다.
그런데다 간성 경찰서에서 나온 형사가 매일 와서 자리를 지켰다. 연세대학을 나오고 훈련받은 사람이 왜 정미소 구석에 앉아서 진료를 하느냐는 것이었다. 가짜 의사가 아니면 간첩일 것이라고 여기고 나를 감시했다. 간성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워 간첩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 달쯤 지켜보다가 치료를 괜찮게 하는 것 같았는지 하루는 형사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저 원장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예, 무슨 일입니까?”
“제 아들이 기침을 많이 해서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 소아과에 다니는데 1년 넘게 주사 맞고 약을 먹어도 낫질 않습니다.” “그래요?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하루는 환자도 없고 해서 앉아 있는데 이상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단번에 그 형사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 부자(父子)가 진료실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기침 소리만 듣고도 진단을 할 수 있었다. 문진을 해보니 역시 내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아이의 엄마가 히스테리였다. 히스테리는 정신과적인 질병으로 정말 괴로운 병이다.
형사인 아버지는 잦은 잠복 근무에 새벽에 출근했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고 아이는 늘 혼자였다. 집에 있으면 엄마가 욕을 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아이는 학교 가서 집에 오면 가방만 던져 놓고 밖에 나가 놀았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다른 아이들은 가족들이 불러서 집으로 가고 늘 혼자 남는 것이다. 집에는 가야겠고, 가면 욕먹는 일의 반복이었다. 밥은 얻어먹지만 사랑을 못 받고, 불안을 느끼는 데서 병이 온 것이다.
아이의 얘기를 다 듣고 나는 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댈 필요도 없이 말했다.
“약 다 끊으세요.” “네?”
아이의 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주사도 맞지 말고 내일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그럼 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왔을 때 둘이 손잡고 개천에 가서 물고기도 보고,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세요. 그리고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 한 그릇 시켜놓고 둘이 나눠먹으세요.”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함박웃음을 지으면서 병원으로 왔다. “선생님, 아이 병이 다 나았어요!”